

정원사 (gardener_77@hotmail.com)
다른 일에 정신을 팔고 있다가 뒤늦게 책장을 훑어보았다. 난감하게도 딱 이걸 쓰면 되겠다 싶은 책이 없다. 그런데 타이밍 좋게도 새로 나온 책 한 권이 흥미를 끌었다. 카렌 암스트롱이 쓰고 이다희가 옮긴 [신화의 역사](원제: A Short History of Myth)―――상당히 눈길을 끄는 기획총서의 첫 번째 권이니 잘하면 괜찮은 입문서일지도 모르겠다 싶었다. 물론 읽고나서 쓸 말이 없으면 시간만 더 촉박해진다는 위험부담도 있었지만.
9쪽까지 읽었을 때 이런 문장이 보였다. “……넷째, 신화는 재미있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신화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잠시 눈살을 찌푸렸다. 많은 신화학이 취하는 태도지만, 개인적으로는 가끔 반감을 느끼는 탓이다. 왜 재미있자고 하는 이야기로는 부족하다는 것인가? 왜 재미와 의미를 분리시키는가? 어쩌면 재미있자고 한 이야기 그 자체로서 많은 의미를 내포할 수 있지 않은가? 신경을 곤두세울 것도 없는 문제이긴 했지만 혹시 또 ‘신화가 우리를 구원하리라!’ 류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앞선 탓이었다. (신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별도로 현대의 모든 문제가 신화 부재에 있다는 식의 발상에는 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다른 기회로 미루자)
그러나 16쪽에서 한 문장이 마음을 두드렸다. “……그러므로 신화란,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주기 때문이 아니라, 유효하기 때문에 진실인 것이다.” 잠시 손을 멈췄다가 책 뒤에 있는 주석을 살펴보았다. 과연, 많은 인용구가 엘리아데에게서 나왔다. 앞에 쓴 문장이 인용구였다는 것은 아니지만 영향을 끼친 것은 명백했다. 즉 이 작가가 이야기하는 신화의 의미는 거의 엘리아데를 단순화시킨 데에 캠벨을 가미한 것이었다.
현대 종교 연구가로서 대중성까지 갖춘 작가라면 엘리아데와 캠벨의 세례를 받지 않을 수 없게 마련이지만, 어쩐지 별로 새로운 내용이 없을 것 같은 예감이 김이 빠졌다. 그러나, 2장 이후를 읽어나가면서 앞서 내린 판단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분명 새로운 이론이나 시각을 제시하지는 않아도 작가는 뛰어난 신화학자들의 논의를 완벽하게 녹여내어 자신이 제시한 틀에 맞추어내고 있었다. 사소한 모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메소포타미아 고대신화에서부터 공자와 노자, 토마스 만의 [마의 산]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신화들을 한 줄에 꿰어 원래 이 책을 쓰는 목적이었을 거대한 화두를 던지는 데 이르면 멋들어진 솜씨라는 감탄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 화두란 바로 이것이다.
소설은 신화를 대신할 수 있는가.
본문이 160쪽밖에 되지 않는 이 짧고 간결한 책은 많은 신화학자들이 던졌던 물음, 지금 이 시대에 신화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물음을 요약해서 제시하는 동시에 ‘신화 다시 쓰기’라는 기획총서가 던지는 출사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작가는 내용을 시대순으로 구성했다. 1장에서 신화란 무엇인가를 묻고, 2장부터 7장까지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신화를 변형시켰는가에 초점을 맞춘 간략한 세계사를 기술한다.
2장. 구석기시대: 수렵민의 신화(기원전 2만년경에서 8000년경)에서는 사람들이 죽음과 삶의 냉혹한 현실에 직면하여 만들어낸 것이 신화가 아니겠는가고 이야기한다. 즉 저자는 신화란 죽음을 비롯한 삶의 고통들을 설명하고 사람에게 위안을 주기 위한 이야기라는 주장을 지지한다. 이후 신화 해석에 대한 저자의 설명은 모두 그 기반 위에 서 있다.
3장. 신석기시대: 농경민의 신화(기원전 8000년경에서 4000년경)에서는 농경이 시작되면서 죽음을 부활로, 통과의례로 해석하고 변화와 성장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으며 그것이 당시 신화에 드러난다고 이야기한다.
4장. 초기 문명시대(기원전 4000년경에서 800년경)는 처음으로 도시 문명이 일어나면서 신들이 밀려나고 인간 문명이 신성화되는 시기다. 그러나 옛 신앙은 부정되고 새로운 신앙은 나타나지 않은 공백기라고 말한다.
5장. 기축시대(기원전 800년경에서 200년경). 기축시대라는 표현은 야스퍼스에게서 빌려온 것인데, 이 시대에 인류 신앙의 발전에 중추가 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유교가, 도교가 나오고 불교와 힌두교, 유대교로 대표되는 일신교, 그리스 합리주의가 모두 이 시기에 나왔다. 이런 새로운 사상과 신앙들은 옛 신화를 적대시하거나, 한쪽으로 밀어놓거나, 포용했다. 이 때 서구는 두드러지게 ‘적대’의 방향으로 향했으며 그 상태가 다음 시기로 이어진다.
6장. 탈기축시대(기원전 200년경에서 기원후 1500년경). 이 시기는 기나긴 신앙의 답보 상태로 요약된다. 5장까지 비교적 균형을 맞추던 작가의 시선은 이제 서구로 쏠리며, 7장. 대변혁(1500년경부터 현재까지)에서 현대의 서구 문명 지배가 어떻게 신화의 죽음으로 이어졌는가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초기 문명시대부터 시작된 미토스와 로고스의 갈등이 근대에 이르러 로고스로 쏠리고, 그럼으로써 더 이상 초월적인 경험을 하지 못하고 이성의 테두리 밖에서 위안을 얻지 못하는 이 시대는 공허과 절망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작가의 주장이다. 그리고 신화가 제공하던 경험을 이제는 소설과 예술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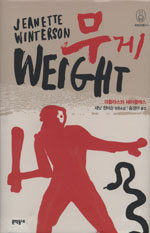
이 결론을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신화의 역사]는 새로운 신화 총서의 도전장을 던진다는 임무에 성공했으며 덤으로 괜찮은 신화학 입문서를 한 권 추가했다. 이제 공은 차례로 출판되어나올 작품들에게로 넘어갔다. 이 책과 함께 출간된 총서 2권 [페넬로피아드](마가렛 애트우드)는 오딧세우스 신화를, 3권 [무게](재닛 윈터슨)는 아틀라스 이야기를 다시 쓰고 있다. 신화와 소설 양쪽을 다 좋아하는 독자로서 과연 이 야심찬 기획이 어느 정도를 보여줄지 기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