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kalai@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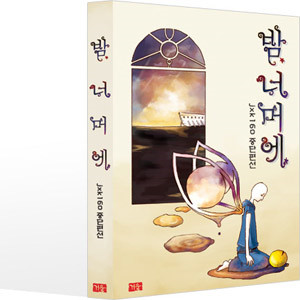
[밤 너머에]는 원래 한 번 리뷰할 생각을 접었던 책이다. 보통 리뷰를 쓴다고 생각하면 둘 중 하나다. 확실히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권하고 싶을 만큼 재미있게 읽었거나. 그런데 이 책은 불특정 다수에게 권할 생각도 들지 않고, 화를 내고 싶은 부분도 없었다. 무엇보다도 하고 싶은 말이 없었다. 혹은 굳이 에너지를 쏟아 글로 정리할 만큼 하고 싶은 말은 없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그런데도 결국 뭔가 끄집어내게 된 데에는 외부 요인이 있었다. ‘어렵다’는 말이었다.
jxk160의 글을 두고 논하다 보니 어느 순간 나도 이 사람의 글을 ‘어렵다’고 수긍하는 것 같아져 버렸다. 그런데 이 사람 글이 정말 어려웠던가? 어려운가? 그래서 구입한 후 몇 편 읽고 놓아둔 “밤 너머에”를 다시 집었다. 쉽게 손이 가지 않을 뿐, 아무래도 읽기 힘들다는 감각은 아니었다. 돌이켜보니 전에도 힘들게 읽은 것은 아니었다.
이쯤에서 끌고 들어오기. 공각기동대라는 영화를 좋아한다. 이 영화를 두고 난해하다는 평이 많았고, 영화의 대사들을 두고 온갖 해석이 오갔다. 인간성에 대한 의문. 기술과 함께 확장하는 생명의 정의. 의미 상실의 시대. 인간 소외. 어떤 면에서 이 해석들은 모두 옳다. 그러나 그건 이 영화의 대사나 줄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다. 이 영화의 모든 대사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무의미하다. 영화 전체로 보았을 때 모든 대사는 이미지를 구성하거나 이미지를 뒷받침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부속 역할을 할 뿐이다. 이 영화에서는 이미지가 주인공이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이미지다.
이 사람 글의 본체가 어디 있을까 생각하다보니 떠오른 게 공각기동대였다. 공각기동대를 보면서 난해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을 읽으려 할 때가 많다. 요컨대 이 작가의 글을 읽으면서 ‘그래서 무슨 이야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읽어보라고 하고 싶어진 것이다. 계속 핵심이나 줄거리를 생각하면서 읽기보다는 그저 직관적으로 느껴야 하는 글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부분 소설에서는 선형적인 시간 흐름과 이야기를 기대하게 된다. 소설이라는 장르 자체가 본래 이야기를 다루기 위해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jxk160의 글은 선형적이지 않다. 손에 잡히지 않는다. 흥미롭게 읽고 나서도 기억에 남는 구절이 없다. 줄거리를 요약할 수 없다. 글 하나가 통째로 이미지화되어 다가올 뿐이다.
물론 이 작가의 독특한 문장을 뜯어보는 것도 나름의 재미가 있고, ‘세계’와 ‘나’의 안팎 뒤집기가 많이 보인다거나, 생동감을 벗겨내어 평면처럼 만들어놓은 입체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거나, 거의 다른 글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급격한 전환이 있는 두 개 혹은 세 개의 글을 등을 맞대고 묶어놓는 것도 흥미롭다. 그래서 어쩌면 이 작가의 대부분 글이 현실과 인식에 대한 질문으로 축약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다만 이런 이야기를 재미로 한다면 모르되 그것으로 소설을 풀어본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느낌이다.
다만 흥미롭게 생각하는 가설은 있다. 어쩌면 이 작가는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쓴다기보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소설보다 시에 가까운 건 아닐까도 생각해 보았으나 역시, 시보다는 역시 언어로 그려낸 그림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최근작으로 올수록 강해지는 경향을 보면 이 작가가 인위적인 시간 순서에 따라 이야기를 배치하고, 그 과정에서 잔뿌리를 쳐내는 기존의 글쓰기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어차피 가공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야기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은 하나의 착각이다. 현실은 소설처럼 시간축을 따라 이어지지 않는다. 축을 설정하는 것은 일상에서도 늘 볼 수 있는 습관이지만, 편의를 위한 인위적 행위임에는 분명하다. 사람의 시각이 본래는 장면 하나를 통째로 시야에 넣게 되어 있으나 훈련에 의해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보게 만들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글쓰기는 이러한 시간축의 관습에 충실하다.
그러나 소설이라는 장르가 분화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관습에서 벗어난 ‘소설’이 나온다. 좋은 예가 얼마 전에 재출간된 미하엘 엔데의 [거울 속의 거울] 같은 경우다. 이 소설은 언어로 이미지를 그린 다음 파편같은 조각들을 가지고 최상의 입체그림을 그려냈다. 조각 하나하나가 완성된 이미지이고, 그 이미지들의 조합은 더 큰 그림을 이룬다. 분석하려고 들면 한없이 어렵지만, 직관적으로 맛보기에는 어렵지 않다. 방식 자체를 두고 말하자면 이건 역시 소설보다는 인문학에 가깝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건 또 다른 이야기고, [거울 속의 거울]은 그저 멋진 글이다. 그리고 내가 jxk160의 글을 본 지 얼마 안됐을 때 떠올린 책이기도 하다. 이미지들의 조합.
[밤 너머에]의 수록작 대부분은 ‘밤 너머에’와 ‘스케치:비’ 사이 어디쯤에 있다. ‘스케치:비’는 깔끔한 한 조각의 이미지, 혹은 한 장의 그림이라면 ‘밤 너머에’는 비교적 시간축을 따라가면서 이미지들을 맞추어낸 건축물이다. 나머지는 부분적인 이미지는 빛날지 몰라도 전체로 보자면 완성되지 않은 부분 그림 같다. 이를테면 ‘인용’은 이미지가 흐릿하므로 중간쯤(물론 이것은 내가 ‘인용’을 이 책에서 가장 재미없게 본 탓에 생각해본 배열이다), ‘별’ 같은 경우는 ‘밤 너머에’에 가까운 쪽. 이 조각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파편, 혹은 시험작이라는 인상을 주며 한 권의 책으로 모아놓아도 여전히 맞아들어가지 않는다는 면에서 미완성품이다. 그것이 작가의 욕심이 과해서인지, 반대로 욕심이 없어서인지, 아무것도 잃지 않으려고 한 탓인지, 이미지를 최대한 원형 그대로 전달하는 것과 날 것 그대로 늘어놓는 것을 혼동한 탓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도 여전히, 파편인 상태로도 jxk160의 이미지는 매력적이다.
아직 하지 않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미완성과 한계, 어느 쪽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게다가 (인문학적으로) 기존의 글쓰기 방식을 전복하려 한다고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의 내용이 아직 세계보다는 내면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불만도 있다. 때문에 나는 아직 이 작가의 글에 대한 호오를 말하지 못한다. 응원하지도 못한다. 할 말이 없다. 생각날 때 가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들춰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