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원사 (askalai@gmail.com)
근 1년 전, 29호에서 [신화의 역사](카렌 암스트롱/이다희, 문학동네, 2005년 10월)를 다루면서 “신화와 소설 양쪽 다 좋아하는 독자로서 과연 이 야심찬 기획이 어느 정도를 보여줄지 기대가 된다”고 썼었다. 이 글은 그 글의 연장선상에 있다. 8월에 신화총서 2차분 두 권이 출간되면서 이 총서가 과연 어떤 방향성을 지니고 있는지 흐릿하게나마 윤곽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선 리뷰에서 이 총서의 화두를 “소설은 신화를 대신할 수 있는가”라고 규정했지만, 현재까지 출간되어 나온 작품 면면을 보면서 판단을 수정해야 했다. 소설과 신화의 거리는 본래 멀지 않다. 신화 다시쓰기, 혹은 신화의 재해석은 언제나 예술가의 몫이었다. 소설이 문학의 중심 자리를 차지하기 전에는 희곡과 시와 음악이 주로 했던 일이다. 그리고 그 재해석은 굳이 이전 신화의 자리를 대신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 재해석은 신화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기존의 신화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 이 총서 역시 그러하다. 작가들 각자가 자유로운 방식으로 다시 쓴 신화는 기존 신화의 새로운 판본으로 의미를 더한다.
다만 이 총서에는 여전히 ‘소설로 다시 쓴 신화’가 아니라는 특징이 남아있다. 이 시리즈에 속한 책들은 [우리가 얼굴을 가질 때까지](C.S.루이스/전경자, 열린, 2002년 4월)처럼 독자적인 문학 작품이 아니며, 그만큼 소설적이지도 않다. 원래의 신화에서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 내용과 작가 개개인에게 맡겨놓은 자유로운 형식 때문에 이들은 소설도 소설 아닌 것도 아닌 기묘한 위치에 서게 된다. 소설로 읽자면 실험적인 소설이고 신화 해석서로 읽기에는 너무 자유롭다.
말하자면 이 기획은 작가들에게 각자 마음에 남는 신화를 골라서 ‘그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고 있을 뿐이다. 작가에 따라 그 결과물은 좀 더 소설에 가까운 것일 때도 있고 읽기 곤혹스러운 것일 때도 있다. 어떤 것은 원래의 신화를 곰씹게 만들지만 어떤 것은 이야기 자체에서 멀찍이 떨어져 점점이 박힌 상징만을 재배열한다. 이러한 다양성은 하나의 시리즈로 묶여 있기 때문에 힘을 갖는다. 따로 놓고 보았을 때는 재미가 떨어지는 글도 다른 작품들과 하나로 엮이면서 의미를 보태기 때문이다. 다양한 형식이 일관된 흐름을 이루는 셈이다.
양쪽에 한 발씩 걸친 기묘한 성격 때문이겠지만, 이 책들은 신화 입문서로서나 그냥 소설로서 추천하기에나 애매하다. 역시 1권인 신화의 역사 정도가 좋은 신화 입문서이자 비교적 ‘쉬운’ 독서경험을 제공하는 정도일 것이다. 분량이 많지 않음에도 이 책들은 그리 수월하게 읽히지 않는다. 그러니 신화와 소설, 둘 중에 택일해야 한다면 소설보다는 신화를 보고자 하는 사람에게 권해야겠다. 물론 둘 다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갈등할 필요가 없겠지만.
현재 나온 총서 목록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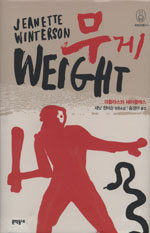


1. 신화의 역사 (카렌 암스트롱/이다희, 문학동네, 2005년 10월)
2. 페넬로피아드 (마거릿 애트우드/김진준, 문학동네, 2005년 10월)
3. 무게 (재닛 윈터슨/송경아, 문학동네, 2005년 10월)
4. 공포의 헬멧 (빅토르 펠레빈/송은주, 문학동네, 2006년 8월)
5. 사자의 꿀 (데이비드 그로스먼/정영목, 문학동네, 2006년 8월)
[페넬로피아드]는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 오디세이아 이야기를 페넬로페의 시각에서 다시 적은 글이다. 절반은 페넬로페가, 다른 절반은 목매달려 죽은 페넬로페의 열 두 시녀가 화자이자 목소리를 맡고 있다. 오디세이아에서 너무나 이상적인 현부(賢婦)요, 꽤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별 존재감이 없었던 페넬로페. 페넬로페는 과연 서사시에 나온 것 같은 그런 인물이었을까? 이 글은 그럴싸한 의문에서 출발한 데다가 작가가 [시녀 이야기]의 마가렛 애트우드라서 기대했던 것에 비하면 실험적인 소품이다.
[무게]의 주인공은 아틀라스다. 지구를 짊어져야 하는 운명을 지녔던 아틀라스는 불우한 출생 때문에 끝없이 무의미한 임무를 맡아야 했던 헤라클레스와 한 순간 조우한 적이 있다. 황금 사과를 따오라는 임무를 맡은 헤라클레스가 잠시 동안 지구를 대신 지고 있을 테니 사과를 따오라고 부탁했을 때다. 이야기는 이 순간에 주목하여 아틀라스와 헤라클레스, 헤라의 관계를 재설정한다. 글을 쓰는 방식은 가벼워 보이지만 짧은 문장에 무게가 있고, 결말이 무척 따뜻하다. 비교적 실험적인 성격이 적고 익숙한 틀을 갖춘 것도 장점이지만 뭐니뭐니해도 재미있다. 네 작품 중에서 가장 소설적인 재미를 보장하는 책이기도 하다.
[공포의 헬멧]은 실험적이라는 면에서 넷 중 가장 극단적인 형태를 보여준다. 메시지보드 방식의 채팅 공간 안에서 기묘한 닉네임을 쓰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으로, 이 사람들은 각기 다른 미궁 속에 갇혀있고 모든 미궁의 중심에는 미노타우루스=공포의 헬멧이 있다. 각 미궁은 가상의 실험 프로그램 같기도 하고 시적인 은유 같기도 하며, 모두 통해있기도 하고 모두 막다른 골목으로 막혀 있기도 하다. 미노타우루스는 테세우스이고 둘 다 거울상이자 무(無)이기도 하다. 이 책의 중심에는 테세우스와 미노타우루스 미궁의 신화가 있지만, [공포의 헬멧]은 익숙한 이야기와는 까마득히 먼 위치에 있다.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한없이 머리가 아파지지만, 마음을 비우고 보면 그냥 농담 덩어리 같기도 한 난해한 글이다. 그러나 [페넬로피아드]가 어중간한 지점에 머물러 있다면 이 글에는 파괴적인 힘을 지녔다는 미덕이 있다. 다른 책이 모두 ‘개인’으로서의 신화 주인공에게 주목하는데 이 책은 세계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도 재미있는 부분.
[사자의 꿀]부터는 드디어 그리스 신화에서 벗어난다. 원 텍스트는 구약신화다. 이스라엘 작가가 이스라엘의 성경(참고로 유대교는 신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을 신화로 볼 수 있었다는 것만도 흥미롭지만, 성경에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있었던 일로 보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해석을 보여준다는 점이 훌륭하다. 삼손은 신력의 소유자, 초인, 거인으로 여겨지고 수많은 영화에서 비극적인 영웅으로 그려졌다. 그러나 사사기에 나온 삼손의 이야기는 기묘하고, 그 안에 그려진 삼손의 모습 또한 영웅과는 거리가 멀다. 그는 모순 투성이다. 작가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실린 사사기 13-16장을 맨 앞에 들이밀고 나서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이고 삼손이 살아있는 사람이었다면... 이 때 그는 이렇지 않았을까? 저렇지 않았을까? 하면서 독자에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묻는다. 삼손의 행적을 따라가는 여행은 때로 이스라엘이라는 기묘한 나라의 운명으로까지 확장된다.
소설로 읽고자 한다면 소설이고, 신화 재해석으로 읽고자 한다면 비소설일 이 책들. 더 다양한 작가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다룰수록 전체 텍스트는 풍성해질 것이다. 6권에서는 [넘버원 여탐정 에이전시]의 작가알렉산더 매콜 스미스가 켈트 신화를, 7권에서는 [이혼지침서]의 작가 쑤퉁이 중국 신화를 다룬다고 하니 기대 중이다(이러면서 은근슬쩍 선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