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원사 (askalai@gmail.com)
서점에 꾸준히 진열되고 팔려나가는 여행기들을 보면 여행도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일까 궁금해진다. 사실 다른 사람의 여행기를 읽는다는 것은 자기 몸을 여정에 싣지 않고 간접적으로 여행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이 아닌가. 가보지 않은 먼 땅의 풍경, 생활, 그곳에서 다른 사람이 겪은 경험... 어쩌면 시대의 생활상을 시시콜콜히 재구성하려는 최근 미시사의 흐름도 공간적으로만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먼 곳을 여행하려는 욕망의 표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미시사라는 의미에서 간접적인 시간 여행일 뿐 아니라 주제도 여행인 책이 있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여행 욕구를 한껏 충족시켜줄 듯한 [고대의 여행 이야기](라이오넬 카슨/김향, 가람기획, 2001년 9월)는 그 제목만으로도 흥미를 끈다. 물론 세상에는 제목만 흥미진진할 뿐 펼쳐보면 대단한 내용도 없는 책이 널려 있다(이름만 그럴싸할 뿐 들어보면 끔찍한 강의가 많은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나 기뻐하라. 이 책의 내용은 제목이 주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2천년 전이라고 하면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좁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때도 여행은 있었고, 관광객과 토산품 장사와 가이드북과 악덕 가이드와 사기꾼도 있었다. 이 책은 고고학적인 유물과 그림과 기록과 문학과 낙서(!)를 총동원하여 세밀한 여행상을 흥미진진하게 엮어나간다.
다루는 내용도 재미있지만 아마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저자가 모아들인 기록을 열거하다가 줄거리를 놓치는 일이 없다는 점일 것이다. 위에서 제목만 흥미롭지 내용 없는 책이 널렸다고 이야기했지만 미시사 계통에는 그 반대의 경우, 즉 내용이 알차기는 한데 세부사항을 살린다는 것이 산만할 지경에 이르러 읽고 나서 남는 것이 파편밖에 없는 것도 많기 때문이다. (물론 전공자가 아닌 입장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고대의 여행 이야기]에서는 수천년의 시간이 빠른 속도로 흘러가고, 관심사에 따라 재미가 처질 만한 부분도 고대 기록에서 낄낄거리고 웃을 만한 대목들을 찾아 뿌려놓은 저자의 재치 덕분에 수월하게 넘어간다. 기원전 2000년경 메소포타미아 기록에서 발췌한 선술집에서 어디에 소변을 봐야 큰 인물인가에 대한 글이나 로마 시대 풍자글에 나오는 “제우스여, 나를 올림피아에 있는 당신의 가이드로부터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아테나여, 아테네에 있는 당신의 가이드로부터도 저를 보호해주십시오.” 같은 기도를 보면 저도 모르게 낄낄거리게 된다.
이 책이 다루는 시간은 기원전 3000년부터 기원후 900년경까지이다. 그러나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기록은 단편적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기원전 300년부터 기원후 300년까지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진다. 중심이 되는 공간은 지중해 세계, 그 중에서도 역시나 가장 많은 기록이 남아있는 그리스와 로마, 이집트다. 읽다보면 고대에 도보로 여행을 한다는 것과 선실 없는 배를 타고 여행한다는 것이 어떠한 과정이었는지 이해하고, 부유한 로마인의 휴가 여행과 후대 기독교인의 순례 여행과 기원 전의 장사 여행과 그리스 축제를 보기 위해 몰려가는 인파와 드물게 있었던 여행을 위한 여행에 대해 윤곽을 그릴 수 있다. 또한 ‘제국’이라는 형태가 길을 닦고 치안을 보장하고 돈과 언어를 통일함으로써 어떻게 사람들의 지평을 넓혀주는지 실감할 수 있다.
역사추리나 대체역사, 시간 여행, 이세계 여행 같은 장르를 읽는 독자에게는 또 다른 재미가 있다. 읽다보면 저 작가도 이 책을 읽었거나, 이와 비슷한 내용을 자료로 조사했겠구나 싶은 대목이 많다. 한 예로 필자는 축제와 신전 호객과 명물 요리(!)를 중심으로 한 고대 그리스의 여행 이야기에서 모 환타지를 연상하고 웃기도 했다.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들은 아니지만 디테일이 살아 있는 만큼 설정을 위해 읽을 자료로도 추천할 만하다.
어쩌면 여행에 대한 욕구란 세계를 넓히고 싶은 욕망과 다르지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 보지 못한 것, 가지 못한 길, 접하지 못한 풍물, 벽이 존재하지 않는 자유에 대한 끌림... 예나 지금이나 미지의 장소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보다 누구나 찾는 관광지에 몰려가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을 보면 여행의 끝은 집으로 돌아갔을 때의 안도감이라는 면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말이다.
그나저나 낙서에 대해서 한 마디 덧붙이지 않을 수 없다. 필자도 해외 여행을 나가서 귀중한 유물에 ‘철수 왔다가다’라고 적는 것을 싫어하는 편인데, 이 책을 읽다보니 그런 낙서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 이집트 고대유물에 ‘로마 군인 **는 감탄했노라’라고 적어둔 낙서들이 지금에 와서는 나름대로 소중한 유물 겸 기록이 되고 있지 않은가. (아무 데나 집어던진 쓰레기도 그렇다!) 그렇다면 ‘철수 왔다가다’는 보편적인 욕망의 발현인가? 혹 시간이 흘러 지금의 문자 기록이 사라지고 나면 그런 낙서도 지구 반대편에서 그곳까지 간 사람들이 있었고 미래의 인류와 마찬가지로 낙서를 남기고 다녔다는 증거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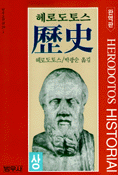




[고대의 여행 이야기]를 읽고 연결해서 읽으면 좋을 책으로는 우선 이 책에서도 한 챕터를 따로 할애한 ‘최초의 여행작가’ 헤로도토스의 [역사](헤로도토스/박광순, 범우사, 1996년 7월)가 있다. 헤로도토스는 (서양) 역사의 아버지로도 불리지만, 여행기에 의외로 자질구레한 일화를 열심히 적고 있어서 편안하게 읽기에도 재미가 있다. 로마 제국 시기에 넓어지는 지평을 이야기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짧게만 언급한 것이 아쉽다면 [로마에서 중국까지](장노엘 로베르/조성애, 이산, 1998년 2월)를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 로마 시대의 여행 문화를 더 재미있게 보려면 로마사의 굵직한 줄거리를 알아두는 것이 좋고, 반대로 더 자세한 일상생활사를 보충하고 싶다면 [고대 로마의 밤문화](카를 빌헬름 베버/윤진희, 들녘, 2006년 7월) 같은 책이 나와 있다. 도보 여행보다 항해에 관심이 많다면 [배 이야기](헨드릭 빌렘 반 룬/이덕열, 아이필드, 2006년 4월)나 [항해의 역사](베른하르트 카이/박계수, 북폴리오, 2006년 7월) 같은 책도 최근에 번역 출간되었다. 중세 이후의 여행과 항해, 동양 고대의 여행은 또 다른 이야기다.
한 가지 결정적으로 아쉬운 것은 책의 편집 상태다. 오탈자가 상당히 많은 데다가 가끔 한 번씩 의심스러운 문장도 나온다. 내용 파악에 큰 지장은 없는 수준이지만 예민한 독자라면 신경질이 날 수도 있다는 점은 각오하시길. 어쩌겠는가. 자고로 여행에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있게 마련이니 :)